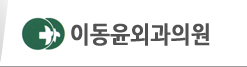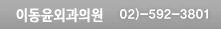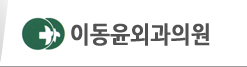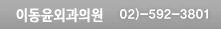|
 |
기억 속의 첫 달리기 대회... |
내 고향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울산으로 가는 언양 인터체인지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산골 동네였다.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집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항상 걸어다니거나 뛰어 다녔다.
요즘은 울산 광역시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들이 동네 바로 옆까지 들어왔지만, 그 때만 해도 뻥뚫린 신작로가 있고 멀찍이 신불산, 가지산, 고현산의 줄기 끝자락이 내려와 있으며, 띄엄띄엄 산기슭에 10~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다. 그 중에도 내가 살던 동네는 태화강 상류의 넓은 하천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서 겨울에는 바람 세고, 춥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물난리 나는 2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이었다.
이미 사라진 과거의 동네 사람들 간의 인정 속에 세상살이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기억을 통해 그 때 꿈꾸기만 하고 존재하지는 않았던 인생살이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북쪽의 산으로 막힌 골짜기에서 남쪽으로 트인 저 넓은 세상에서의 삶을 푸른 하늘 마냥 바라보며 느끼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학교 갔다오면 집안 일이나 농사일을 돕고, 소나 돼지, 닭, 토끼 같은 가축을 돌보고 먹을 챙겨주고, 동생들을 업고 밥과 소죽을 끓이거나 소를 몰고 풀을 뜯어 먹이러 산으로 가곤했다. 산은 정말 멋있는 운동장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훈련을 다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달리기부터 나무타고 오르기, 물흐르는 계곡 바위에 낀 이끼를 이용해 미끄름타기, 지형지물을 이용한 장애물 경기 등등 무궁무진한 놀이터이자 훈련장이었다.
뛰거나 걷는 것이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그 시절에 달리는 것은 밥 먹으면 학교 가듯이 굳이 말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 아이나 개나 똑같이 서로 경주하듯 달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광경이었다. 군대에서 선착순 구보가 있듯이 일상생활에서도 달리기는 삶의 모든 과정을 엮어주는 실과 같았다.
학교 등하교 시간에 친구들과 거리를 정해두고 빨리 달리기를 경주하듯이 산에 나무하러 가면 재빨리 한 짐 해두고는 고갯마루까지 빨리 달려갔다 오기 시합이나 싸름을 하기도 했다. 혼자서도 딱히 할 일이 없을 때는 앞 산에 가서 능선이나 정상까지 달려올라 갔다가 막상 정상에 도달하면 멈추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시 아래로 내달리기를 반복하곤 햇다.
심장이 헐떡거리고 가슴이 터질 듯 숨이 차는 그런 상태까지 나를 내모는 것이 너무 기분좋은 일이었다. 나를 넘어섰다는 일종의 성취감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자랑스레 나의 성취를 이야기하면, "비싼 밥 먹고 쓸데없이 힘쓰고 다니지 마라!"는 핀잔을 받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잘 했다고 칭찬 좀 해주면 안되나?' 궁금했지만, 굳이 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냥 응당 부모님들은 쌀 한 톨 만드는 일 년의 농사과정의 힘든 삶을 생각하며 내가 공부 같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분야에 에너지를 쏟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달리기에 소질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나는 느림보 였지만 지구력은 자신이 있었다.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상을 타본 기억이 한 두번 정도 밖에 없다. 그것도 일등이나 이등, 혹은 삼등은 아니고 연필 하나 주는 4~5등이 고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집에서 달리가를 하는 것은 그냥 내 일상 생활의 일부였지 그것이 잘달리기 위한 훈련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형 친구들이 세 사람이나 부산동래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사보낸 덕분에 어머님께서 "그냥 무시하면 보내준 분들에게 미안하고 도리도 아니니까 한번 가서 시험이나 쳐봐라."하셔서 갔다가 합격하는 바람에 수업료가 무료인 울산공업고등학교 진학 계획이 부산으로 바뀌었다. 부산 동래에서 하숙하다 자취하다를 반복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개교 기념 축제 때 학교에서 수영 비행장까지 왕복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10km 건강달리기( 그 시절 명칭으로는 10km 단축 마라톤대회)'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는 10km를 달려본 적이 없었고, 부산에 와서는 운동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일요일 고향집에 왔을 때 말고는 별로 달려본 적도 없었다. 부산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달려올라가거나 심지어 토끼뜀으로 약 1km 정도의 작은 언덕높이인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도 근육과 가슴과 호흡은 힘들지만 시골에서의 그런 해방감은 느낄 수 없었다. 등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푸른 하늘과 넓은 도로, 그리고 맑은 공기,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숨소리, 맥박소리, 귀곁을 스치는 바람소리까지...나를 자연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디에도 더 이상 없었다.
학교 축제 때의 첫 10km 대회를 달리면서 처음으로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자유와 힘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젊음의 자유가 흘러넘치는 삶의 자유이자 신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담아 두기 어려운 힘의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그 시절보다 훨씬더 나이가 들었지만, 젊음의 자유였던 그 힘이 이제 노년의 자유로 나에게 달리기를 멈출 이유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건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비자의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날 이후 계획없이 할 수 있는 달리기가 내 삶의 주제가 되었다. 내가 산을 뛸거라고 계획을 하고 산을 간적은 없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산을 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치지 않고 달려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2013 서초구 의사회 소식지 가을호) |
|
|
|